- 입력 2024.12.26 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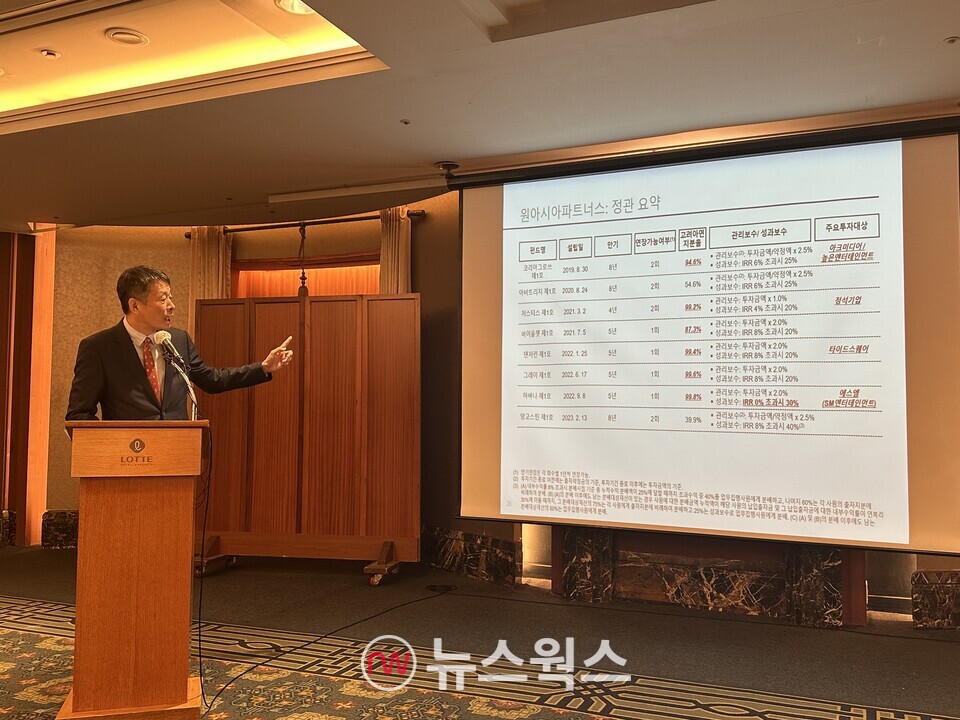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외국인 투자' 논란이 미국 연방 규정까지 거론되며 확대되고 있다. 금융계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조계는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 때 이를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며 정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MBK는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자이며, 공동대표인 부재훈 부회장과 최고운영책임자인 민병석 파트너도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MBK의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한 거부권을 가진 인물도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점도 금융계의 의혹을 키웠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며, 최대 주주는 한국인"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일 부회장이 최대 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미국의 연방 규정과 비교되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CFR)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을 "외국인, 외국 정부, 외국 단체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단체"로 정의한다.
CFR은 '통제(Control)'를 법인이 유·무형 자산의 양도, 주요 투자 및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 체결과 해지, 임원 및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으로 규정한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MBK의 경영진 구조와 지분 구성을 고려할 때, 미국 규정을 적용한다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법조계는 MBK의 인수합병(M&A)이 현행 법률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인 만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외국인 투자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지정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라며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내법에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며 "외국인과 내국인, 헤지펀드 등 어떤 주체든 지분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현중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MBK의 최대 주주가 한국인이고, MBK 자체도 국내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외국인 논란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 의회 내 '핵심광물협의체' 공동의장인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는 배터리 소재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 자본이 고려아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