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1 13:00
이홍준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김포아이제일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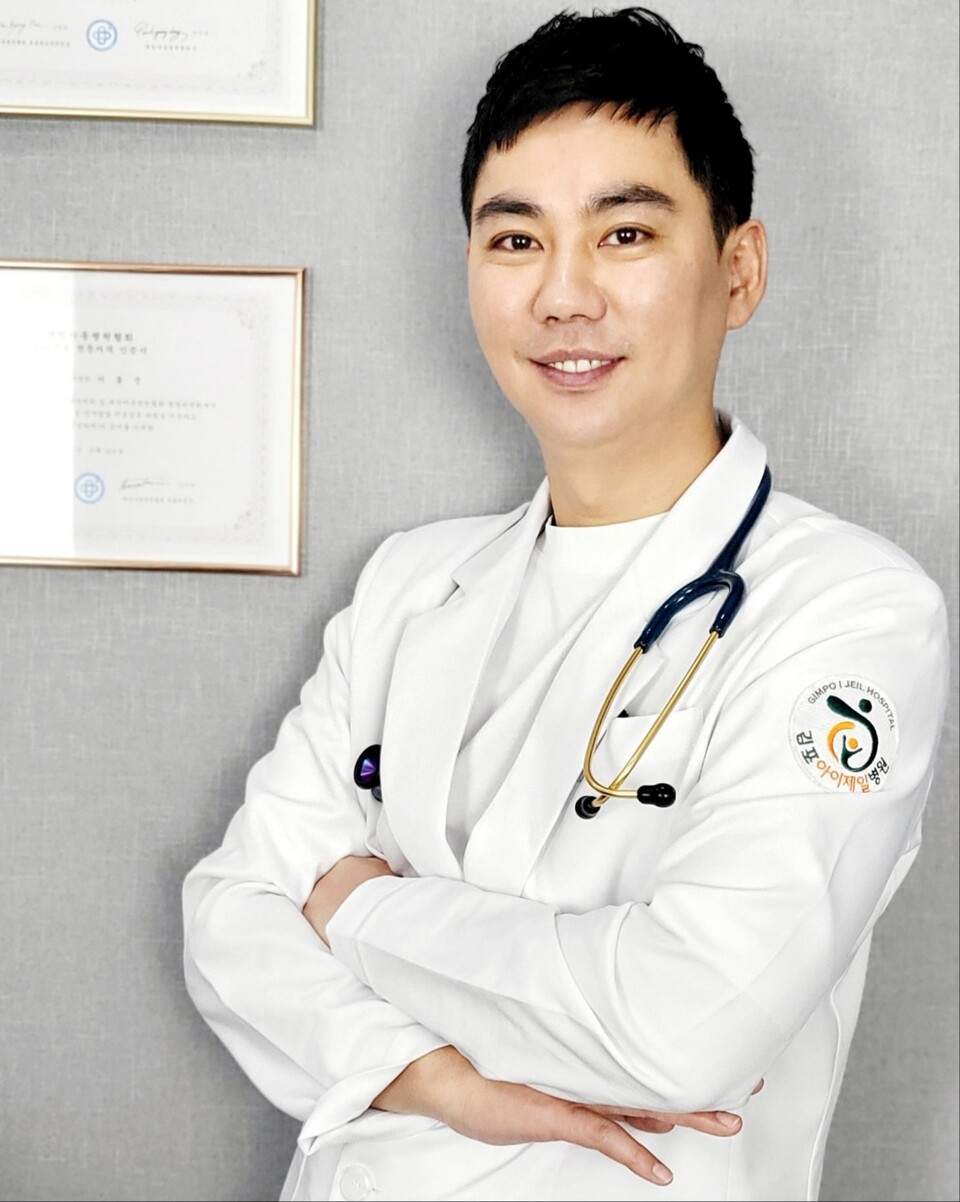
며칠 전, 생후 5개월 된 환아가 본원에 입원했다. 환아는 미숙아들이 통상 갖고 있는 합병증들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더군다나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어 본원으로 이송된 것이어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당시 필자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본원 의료진들에게 약이 충분한지를 먼저 물었다. 약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치료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3~4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약이 부족해 환아 치료를 못 할 수 있다는 걱정 자체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이것이 현재 OECD 국가 중 의료접근성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필수 약 품절 사태와 관련한 대책 마련 촉구 간담회를 지난해 열었던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한국 출시를 놓고, 포기를 고민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다.
신약을 만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에 신상품 출시를 꺼린다는 내용이다. 이들도 약물 공급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약값이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약물은 개발된 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어서 특허가 풀린 카피품들이 많아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값이 쌀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약값을 더 싸게 통제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된 약값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맞지 않는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코 약값의 무분별한 인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정한 약값과 계약이 있어야 제약사 입장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수시 품절 등에 놓인 약물이 수두룩하다. 약국의 연락을 받아 가며 처방 냈던 약물을 삭제하거나 대체재로 바꾸는 게 일상이 됐다.
올해 8월 현재 식약처에 따르면 400여 종의 약품이 공급 부족 내지는 중단 상태에 있다. 제약사들은 대부분 약품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뒷맛이 씁쓸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약의 재고를 걱정해야 하는가'인 것이다.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의 문제는 약값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소아청소년 의료 불균형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관련기사
- [기고] 정부와 국회는 '소아 의료' 재난을 선포하라
- [기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발진도 모자라 시대 역주행하나
- [기고] 연금계좌로 노후 준비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 [기고] 소아 의료 체계 붕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이 해결책"
- [기고] 소아과 의사 잡는 '불가항력적 의료 소송' 안전장치 절실
- [기고]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소아청소년 생명보호 안전망 구축해야"
- [기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속 감소…"정부부처에 전담부서 만들어야"
- [기고] 정부에 묻는다…"갈데 없는 소아응급환자 어쩔 셈이냐"
-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소아의료체계 붕괴…선의에 기댄 정책 대신 지원 필요한 때"

